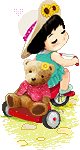행복이 머무는 자리
광토 김인선
시기하지도 다투지도 않고 모두를 사랑하며 고요하게 숨 쉬는 것이 행복인데
모두 엉켜 헐떡이라고 장난치듯 우리의 삶엔 언제나 세찬 바람 분다
마개 뽑힌 샴페인의 거품 속에 허상의 거리는 풍요가 판을 치며 날마다 찔러오는 헛된 빛으로
눈물샘마저 욕망에 빼앗겨 울음조차 사라진 세상에서
마른 눈동자 굴리고 굴리며 오르려는 이 으스스한 신화의 끝이 대체 어딘지 궁금하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삶의 지령이 퀵 서비스로 배달되는 하루
바위를 껴안고 노력의 산을 오르는 시시포스를 비웃고
정도가 삭제된 지름길을 가며 정당한 싸움판의 비겁한 승자가 되어
패자를 아파해 줄 아량마저 상실한 바보들이 생존의 들판에 가득하다
이기의 타성으로 무작정 달리는 냉혹한 생의 욕망에 취해
염주와 묵주의 작은 구걸조차 못 본 척 지나치고
덧없는 경주에 눈먼 길치가 되어 고장 난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화살표에 마비된 뇌는
이 삭막한 이 도시에서 슬픈 사랑 치마저 되고 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간혹 빠져드는 착각 하나 그것은 홀로 외롭다고 느끼는 것이다
어깨를 껴안고 귀를 기울이면 모두가 겪는 고독의 병이건만
산길을 걷다 어쩌다 잘못 들어서서 아무도 없는 오솔길을 걷다보면 외떨어진 듯한 쓸쓸함을 느낀다
하지만 좁은 오솔길은 산허리 돌면 사라질 생의 옵션일 뿐
이름모를 작은 들풀과 눈 맞추는 차가운 시간을 굳이 슬퍼할 이유가 없다
신은 곧 우리를 갈림길에 세울 것이고 선택의 순간이 되면
누군가의 미소를 보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지친 걸음 멈추고 잡초뿐인 길섶 습한 도랑에서 기고 있는 지렁이를 보라
무언가 말하고 있다
잠시 들어보지 않겠나
있는 듯 없고
비운 듯 차있는 것이라 인생을 어렵게 말하지 마
저승 다리 밑에서 태어나
괜히 알딸딸한 혼 지닌 채 잘난 척하지만
겉과 속 다르면
나처럼 축생마저도 못할 거야
고고한 척 허상 떨며 얼버무리지 마
존재가 공이라고
그리 뻔한 세상을 무엇하러 살아
그런 귀찮은 소리 싫어 나는 머리통 없애버리고
이리, 몸통으로
꿈틀거리며 사는 거야
그렇다, 뿌옇게 시야 가리는 매연의 심해에서 목 조이는 다시마 줄기를 풀며
녹슨 호멩이를 쥐고 우리는 하루하루 번민과 고뇌의 개펄을 파헤치고 있다
딱지 맞은 견적서, 카드 사용 명세서, 대출 이자 독촉장이 가득 찬 망사리에 부딪히는 물결
언제나 몸이 흠뻑 젖는다
숨 막히게 물질하는 수면 너머 우뚝 선 부의 활화산이 보이지만
이제 가슴 속 뜨거운 용암을 뱉어내야 한다
욕망을 식혀 숭숭 구멍 난 가벼운 돌덩이가 되어 내 위에 나보다 더 가벼운 너를 올려놓고
작은 불 덕 하나 만들어 정겨운 사랑의 모닥불을 피워야할 때다
한 서린 생의 짠물이 흐르는 낡은 소중기를 벗어야 한다
한가락 숨비소리 지르며 망망한 바다에 파도 타는 테왁을 감싸안 듯
아름다운 배려를 품고 길고 길었던 물질의 서러움을 서로 위로해야 한다
언제나처럼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마다 회색으로 덧칠된 구속 막을 벗어나 자유 속 던져진 날개를 본다
반짝 눈물 보이며 나뭇가지에 앉아 우는 모습
피어날 곳이 아니건만
때가 아니건만
바람과 타협하지 못한 운명이라
만년설로 향하던 상승기류를 놓친 탓에 갈망의 동선이 끈겨 무너진 양력으로
가는 우듬지에 내려앉은
허무라는 해답을 걸친 눈꽃이 그것이다
속된 거리 뿌리 박은 가로수에 헛헛하게 자리하고
덧없이 스러져 갈 하얀 날개
그것을 어떻게 눈꽃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 부르겠는가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한낱 눈꽃처럼 녹아내릴 하루살이 날개를 지녔지만
그러나 만져보라
가슴이 뜨겁지 않나
하여 아름다운 사랑 지니고 주위를 둘러본다면 소중한 선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누릴 축복
그것은 모두의 그림자에 가려진 소외된 곳에서 찾아야 한다
행복의 자리란
언제나
등 뒤에 있다는 것을...
나는 걸으리라
본능의 나침반에 고정된 실낱같은 바늘
그것이 가리키는 곳으로
작은 창 불빛에 작은 돌부리가 옹기종기 모이고
누웠던 종이비행기가 다시 날고 싶어 버석거리는 골목길
정겹게 선 나란한 벽
두근대는 가슴으로 그린 예쁜 순이 얼굴 아래
초승달이 깜빡 졸면
'너 좋아해'라고 아무도 몰래 써 놓고
붉은 뺨 꼬집으며 나무라는 찬바람의 손바닥 피해
도망치듯 빠져나오던 곳
지붕 가려진 토막 난 은하수가 새파랗게 내려와
처마 사이에 다리 놓으면
깔깔거리는 순이 웃음이 굴뚝 따라 나와
고운 별을 밟고
가는 창살 두드리며 '네가 썼지'
가슴 철렁했던 곳
참으로 아늑했던 시간을 찾아가리라
몽롱한
새벽 안개 오기 전에
잊히기 전에
-'행복의 나라로' 전문 -
'마음을 여는 글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너만의 향기는 그리움이야 (0) | 2013.11.02 |
|---|---|
| [스크랩] 중년에 찾아든 그리움 (0) | 2013.11.02 |
| [스크랩]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시면 (0) | 2013.11.02 |
| [스크랩] 나이 들면서 생각해보는 인생사 (0) | 2013.11.02 |
| [스크랩] 가을날에.. (0) | 2013.11.02 |